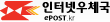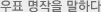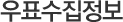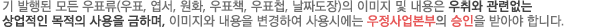고려시대 때 매를 사용해 꿩을 잡는 매사냥이 유행이었다 . 당시 궁궐에서부터 시작된 매사냥은 귀족사회로 퍼지며 많은 이들이 매사냥을 즐겼다. 매사냥이 성행하자 길들인 사냥매 도둑질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래서 서로 자기 매에게 이름표를 달아 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시치미’이다. 시치미는 직사각형의 소뿔 등의 재료에 이름을 새기고 방울과 함께 매의 꽁지에 매어 주인을 표시했다. 그런데 매를 훔쳐 간 도둑이 이름표인 시치미를 떼고 자기 매라고 하는데서 ‘시치미를 떼다’라는 말이 탄생했다. 훈련이 잘된 매의 가격이 당시에 소 한 마리 값이었다고 한다. 매사냥 법은 사냥꾼들이 꿩을 한쪽으로 몰다가 꿩이 날아오르면 매가 꿩을 낚아채는 방식이다. 이때 꿩을 잡으면 '매가 꿩을 몰아서 차다'라는 표현을 썼다. 이 말이 줄어 '매몰차다'라는 말이 되었다. 매는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함부로 잡거나 키울 수 없다. 매를 잡으려면 포획허가서를 제출하고, 받은 매는 소유하지 못하고 국가에 신고해야 하는 등 규제가 까다롭다. 그나마 사육도 문화재청에 등록된 기능보유자와 이수자에게만 허락되므로 일반인들은 매를 키울 수가 없어서 시치미를 뗄 수가 없다.

세종도 매사냥을 즐겼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역대 왕들의 매사냥 횟수는 총 157회인데, 이중 세종의 것만 42회에 이른다. 아버지 태종의 59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세종은 민감했던 시기인 즉위 원년(1418)에도 사간원의 줄기찬 상소를 무시하며 매사냥에 나섰고, 궁에서 매를 키우기까지 했다. 세종은 매를 정치적으로도 사용했다. 세종 8년(1426) 명나라에서 말 2만 5000필을 바치라고 하자 사냥용 매 12마리를 보내 난처한 조공 요구를 뇌물로 잠재운 것이다. 이것은 명나라 황제 선종이 매사냥을 무척 즐겼다는 점에서 착안한 영민한 방법이었다. 우리나라 매사냥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 이래로 꾸준히 이어져 왔고 신라의 진평왕, 고려의 공민왕, 조선의 연산군 등 매사냥을 탐닉한 군왕들의 이야기도 많이 전해진다. 상류층의 고급 레포츠로 사랑받아온 매사냥의 위상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매사냥의 무엇이 제왕의 마음을 훔친 것일까. 고려 공민왕의 말에서 답을 더듬어볼 수 있다. 공민왕은 지나친 매사냥을 경계하는 신하들에게 “수렵을 위함이 아니라 매의 사나운 성격을 좋아하기 때문에 매사냥을 한다.”라고 하였다.

매는 시력이 좋다는 조류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시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보다 8배나 멀리 볼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5배가 넘는 시세포가 황반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매의 눈’이라는 관용어구가 여기서 나온 것이다. 매는 몸길이가 34~50cm, 몸무게는 약 550~1,500g이며 양쪽 날개를 편 길이가 80~120cm에 이른다. 암수는 생김새가 거의 같으나 암컷이 수컷보다 더 크다. 생존 전략 중 가장 큰 장점은 갈고리와 같은 부리는 먹이를 뜯어 먹기에 좋고 특히 윗부리에는 매과 맹금류의 특징인 이빨 모양의 날카로운 ‘치상돌기’가 있어 이를 이용해서 먹잇감의 척추나 숨통을 단번에 끊어서 제압한다. 조류는 이빨이 없어서 포유류처럼 음식을 씹어서 삼킬 수가 없다. 육식인 매, 부엉이, 독수리 등과 같은 맹금류는 부리나 발톱으로 먹이를 찢어 먹으며 작은 먹이는 통째로 삼킨다. 이때 소화가 되지 않은 뼈나 깃털 등은 뱃속에서 뭉쳐져 덩어리가 되는데, 새는 이것을 입밖으로 토해 내는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다. 새들이 토해내는 소화되지 않은 이물질 덩어리를 펠릿이라고 한다.

매는 크기와 나이 등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초고리(새끼 매, 작은 매), 수지니(새끼 때부터 사람이 키운 매), 날지니(야생의 매), 육지니(날지못 할 때에 잡아다가 길들인 1살 채 안된 매), 초지니(2살 매), 재지니(두해 묵은 3살 된 매), 보라매(1살 채 안 된 새끼를 포획 후 키운 매. '보라'는 몽골어로 '갈색'을 뜻한다.) 등이 있다. 사냥감을 보고 광채를 뿜는 매의 눈, 호쾌한 몸짓, 군더더기 없는 몸매,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다. 매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언제고 날아가고 싶을 때 가버리면 그뿐이다. 사람은 매의 마음을 얻어 잠시 곁에 두는 것뿐이다. 자연 그대로인 매와 함께 자연 속에 들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매사냥의 매력이다. 꿩이나 토끼를 잡자고 매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응사(매사냥꾼을 이르는 말)는 세 마리 이상의 꿩을 잡지 않는다고 했다. 아무리 아끼는 매라도 겨울 한 철 사냥을 마치면 놓아주고, 길어도 3년 이상을 데리고 있지 않는다. 풀어준 매는 다시 돌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돌아온다 해도 다시 받지 않는 것이 매사냥의 불문율. 자연을 잠시 빌려 자연 속에서 잘 놀면 그뿐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