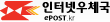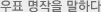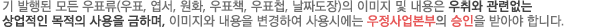지금은 할머니가 된 최민자씨의 기억은 또렷했다. 1951년 아홉 살 소녀였던 그는 1·4후퇴 때 부모님을 따라 피란길에 올랐다가 혼란 중에 미아가 되고 말았다. 안양쯤에서 가족을 잃은 그는 피란민을 따라 가다가 빈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너무 피곤했던지 다음날 해가 중천에 뜬 뒤에야 깨어났다. 피란민은 모두 떠나버렸고, 자신의 배낭과 코트, 신발까지 사라지고 없었다. 맨발로 길을 나선 소녀는 저녁 무렵 극심한 허기와 추위,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눈 위에 쓰러졌다.
때마침 철수 중이던 터키군 장교가 그곳을 무심히 지나쳤다면 소녀의 운명은 거기서 끝이 났을지도 모른다. 차에서 내린 쉴리만(Fulat, Suliyman) 대위는 소녀가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걸 확인하고 담요에 싸서 주둔지로 급송했다. 다행히 소녀는 목숨을 건졌다. 터키군은 오갈 데 없는 소녀를 부대 안에서 보호했다. 군용 담요로 옷을 해서 입히고, 신발도 특별히 만들어 신겼다. 소녀는 부대의 마스코트가 됐다. 금방 터키 말을 배워 서투르게나마 통역까지 했다고 하니 귀여움을 잔뜩 받을 만했다. 쉴리만 대위는 소녀를 딸처럼 극진히 보살폈고, 소녀도 그를 ‘파파’라고 부르며 따랐다.
터키군 덕분에 8개월 후 소녀는 무사히 가족을 만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쉴리만 대위의 부대가 귀국하기 직전의 일이었다. 철부지 소녀는 수송초등학교와 창덕여고를 거쳐 고려대에 진학했고, 그 사이 쉴리만 대위와도 연락이 끊어졌다. 세월은 덧없이 흐르게 마련이다. 잊을 수는 없지만 되살리기도 힘든 터키 병영의 인연은 그렇게 최씨에게서 아득히 멀어질 뻔했다.
우표와 우취가 없었다면 아마 그랬을 것이다. 소녀가 대학생이던 1962년 ‘5·16혁명 제1주년 기념 국제우표전시회’가 서울 광화문우체국 5층에서 열렸다. 터키 우표에 등장한 소녀를 찾던 우취인은 최씨가 대학생이 돼 있는 걸 알고 전시회에 초청했고, 그때 여씨가 그를 만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뒤의 소식을 알 길이 없었다. 여씨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라는 제목으로 본란에 사연을 소개하는가 하면 저서 <여해룡의 우표여행>(한누리미디어)에도 그 내용을 실었다. 그게 단서가 되어 KBS가 최씨를 수소문해 찾았고, 마침 터키 여행을 계획하고 있던 최씨는 한국과 터키 관계자의 도움으로 쉴리만 대위의 유족이 사는 곳을 알게 돼 그들과 극적인 상봉을 할 수 있었다.
아쉽게도 쉴리만 대위는 1987년 작고했지만 최씨는 그의 부인(83세)과 자녀, 그리고 당시 같은 중대에서 그와 함께 근무한 소대장을 만나 감격을 나눴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우표에 실린 원본 사진을 비롯해 그가 군인이 만든 신발을 신어보는 장면, 군인들에게 터키 말을 배우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도 찾을 수 있었다. 최씨는 우표 한 장에 얽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쉴리만 대위가 목숨을 구해준 일부터 부모를 다시 만난 일, 그 사연이 기사화되고 우표가 발행된 일, 60여년 뒤에 유족을 찾은 일까지 모두가 극적이었다”고 말했다.
우표는 그 시대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작은 역사책’이자 수많은 사연을 비장한 ‘이야기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우표에 얽힌 최씨의 삶이 그것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