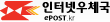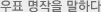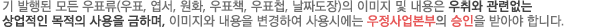비닐봉투에 금붕어 한 마리를 담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오는 아이가 있었다. 다가가서 “왜 그러니?” 하고 말을 걸자 아이가 눈물을 훔치면서 말했다. “엄마가 금붕어를 강에 버리고 오래요. 저는 금붕어가 좋아요. 버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집으로 가지고 돌아가면 엄마가 화장실에 버린대요.”
일본 담수어 연구가이자 열렬한 강 살리기 운동가인 야마사키 마쓰아키(山崎充哲)의 책 <강물의 숨소리가 그립다>에 나오는 대목이다. 외래종 수생동물을 강에 방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상용 또는 애완용으로 기르던 물고기를 강에 놓아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금방 잡아먹히거나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찍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남더라도 그것은 위험하다. 천적이 없어 기존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식용으로 도입된 황소개구리·파랑볼우럭(블루길)·큰입배스라든가, 관상용으로 기르던 붉은귀거북(청거북) 등이 하천이나 호수에 방류돼 토종 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것이 그 예다.
야마사키가 금붕어를 강에 버리기 싫어서 우는 아이를 보고 생각해낸 것이 ‘물고기 우체국’이다. 가정에서 더 이상 기를 수 없게 된 물고기를 받아 기르고 싶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방법을 찾다 생각해낸 모임이다. 그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마음 놓고 버릴 수 있도록 전용 활어조를 만들었다. 물고기 우체국이라는 이름은 마침 구마모토시에 사정이 생겨서 보살필 수 없는 신생아를 맡아주는 ‘아기 우체국’이 설립된 것에서 착상해 지었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물고기 우체국이 언론에 소개되자 거피 같은 열대어가 한번에 2000마리나 들어올 정도로 호응이 컸다. 주로 거피와 네온테트라, 에인절피시처럼 가정에서 쉽게 번식하는 물고기가 많았고, 80㎝까지 자란 앨리게이터 가파이크와 같은 귀한 어종이 들어오기도 했다. 그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물고기 우체국’ 대표를 맡아 유기되는 애완용 물고기를 줄이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우체국의 사전적 의미는 무미건조하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딸려 우편, 우편환, 우편대체, 체신예금, 체신보험, 전신·전화 수탁업무 따위를 맡아보는 기관’(표준국어대사전)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정서 속에 남아 있는 우체국의 이미지는 그 이상이다. 소식과 사랑과 희망과 소원,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희로애락이 모이는 중심지이자,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는 전능의 네트워크라는 인식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아기 우체국이라든가, 물고기 우체국이라는 이름은 그런 이미지로 인해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다.
뜬금없이 우편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물고기 우체국을 소개한 것은 우체국이라는 말의 상징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우체국은 공익적인 가치와 보편적 서비스 기능을 가진 최상의 네트워크를 상징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사업 적자 등 경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공익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올해 약 81억원을 들여서 벌이는 공익사업은 주로 소외 아동·청소년, 여성 노숙자, 이주 여성, 무의탁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소외 이웃을 넘어 사라지는 자연과 생태에 대한 관심이다. 이와 관련한 우정사업본부의 공익사업은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그린 업사이클링’과 금강소나무 재조림을 위한 ‘우정숲 조성’ 정도를 꼽을 수 있다. 그린 업사이클링 사업이 환경 보호와 더불어 여성·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듯이 환경·생태 분야의 공익사업도 그런 연결이 가능할 것이다.
물고기 우체국이 ‘우정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우체국이 사랑의 메신저, 복지의 메신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과 생명을 돕는 ‘생태의 메신저’로 불리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