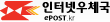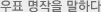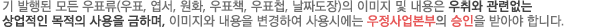지난 6월 남아공 월드컵 때 태극전사들이 입은 유니폼이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옷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겉보기엔 종전 유니폼과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전혀 다른 재질의 옷인 것이다.
페트병이 어떻게 옷으로 변신할 수 있을까. 플라스틱 성질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원리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다. 버려진 페트병을 수거해 아주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녹인 다음 정제작업을 거쳐 가는 실로 뽑아내면 옷 만드는 원사가 된다. 이런 기술은 국내외 여러 업체에서 이미 개발돼 상품화하고 있다. 남아공 월드컵 때 한국팀뿐만 아니라 미국, 브라질, 포르투갈, 호주, 뉴질랜드,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등 나이키에서 후원한 9개국 선수들이 페트병 유니폼을 입고 뛰었고, 국내에서도 SK 와이번즈 야구팀이 SK케미칼에서 만든 페트병 유니폼을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도 이들 스포츠 선수의 옷차림은 TV를 통해서나 볼 수 있지만, 페트병 유니폼은 조만간 모든 국민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가 전국의 집배원 복장을 페트병 유니폼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새 집배원 제복은 니나유니폼과 준도어패럴이 페트병 재활용 기술 보유업체인 효성과 파트너가 돼 만들었다. 제작비는 바지와 상의 한벌에 6만6000원, 외투 4만9000원 등 모두 18억7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기존의 바지와 상의 제작비가 5만5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1만원 이상 비싼 셈이다. 이미 제작이 완료돼 각 우체국에 전달됐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집배원들이 모두 옷을 갈아입게 돼 있다.
가격도 만만찮은데 왜 재활용 유니폼일까. 무엇보다 환경을 고려한 정책이라는 게 조용민 우정사업본부 노사협력팀장의 설명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그린포스트 2020을 발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 줄이겠다고 대내외에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우정사업본부를 찾는 고객들은 한낮에도 복도가 어두컴컴한 것을 보고 놀란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복도의 전등을 거의 껐기 때문이다. 웬만한 곳에는 형광등을 빼는 데 그치지 않고 전등이 있는 자리 자체를 없애버렸다. 이번 여름 찌는 듯한 더위에도 에어컨을 거의 틀지 않았고, 지난 겨울 그 추위에도 실내온도를 높이지 않아 오들오들 떨면서 근무한 직원도 있었다. 말로만 에너지 절약을 외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페트병 유니폼은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집배원 옷 한 벌을 만드는 데 재활용 페트병이 11개 들어간다. 집배원 1만7000여명이 입을 상의와 점퍼를 만드는 데는 총 38만9000개의 페트병이 필요하다. 페트병을 생산하려면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데 재활용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게 된다. 1만7000명 집배원들이 입는 옷을 모두 페트병 재질로 만들면 탄소 2만2000kg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자동차가 10만㎞를 달릴 때 발생하는 탄소량을 집배원 유니폼 하나로 해소하는 셈이다. 만약 나무가 숨을 쉬어 이 정도의 탄소배출량을 상쇄하려면 수령 50년된 나무 1300 그루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국의 집배원이 페트병 유니폼을 입으면 1년에 나무 1300 그루를 키우는 것과 같다는 얘기다.
물론 집배원 옷을 환경 차원에서만 바꾸는 것은 아니다. 지난 6년간 집배원 복장에 변함이 없어 디자인을 바꿀 때가 됐다는 여론이 있었기에 교체하게 된 것이다.
옷은 특정 직업인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집배원 옷이라면 누가 언제 어디서 보더라도 한눈에 ‘아, 저기 집배원이 오는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또 우편배달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 페트병 옷은 가벼우면서 질기고 방수효과까지 있어 집배원 복장으로 적합하다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진단이다. 남궁민 본부장은 “친환경 옷을 입은 집배원들이 매일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자연스럽게 녹색성장을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 보급하는 다른 옷도 친환경 소재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