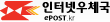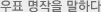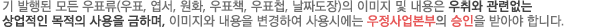아프리카 남동쪽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벌어진 일이다. 한 주재원이 비즈니스차 이탈리아 비자를 신청하러 이탈리아 대사관에 갔다. 때는 목요일 오전 11시. 비자를 발급해줄 영사는 없고 여비서 혼자 있다.
이 여비서는 영사가 식사하러 나갔으며 오늘 안들어오고, 내일(금요일)은 사무실에 안나올 것이라고 말한다. 친절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대사관 여직원의 태연한 표정이 눈에 잡히는 듯하다. 주재원의 얼굴은 사색이 된다. 오늘 비자를 받지 못하면, 내일도 안나온다는데, 그럼 후속 일정이 모두 일그러지는데, 이를 어쩌나. 그때 주재원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비서님, 혹시 우표 수집 하시나요?”
“예? 아, 수집합니다.”
주재원은 옳거니 싶어 지갑에서 소인 찍힌 한국기념우표 20여장을 꺼내 내민다. 이를 본 비서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여기서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차를 몰고 나간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에 있던 영사를 사무실로 모시고 온다. 그것으로 상황은 끝. 주재원은 소지하고 있던 한국 우표 덕분에 기적처럼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다음 블로그 ‘제1세대 해외주재원 생활’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동료 주재원이 우표를 갖고 있었던 까닭에 대해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너무 몰라 국가 홍보용으로 지참하고 다닌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해외에 나오기 전 국내 근무를 할 때부터 우표 모으기를 해 왔으며 그게 마다가스카르에서 진가를 발휘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우표가 우편요금의 선납(先納)을 나타내는 증표 역할에서 벗어나 한 나라의 역사, 지리, 과학, 예술, 문화, 자연까지 반영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하지만 우표가 외국에서 이토록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얘기를 들으니 놀랍기만 하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우표가 나라의 홍보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표가 나오는 날이에요. 우표 사러 우체국에 갈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렙니다. 마치 결혼 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러 나갈 때처럼. 진한 커피향처럼 오늘 하루도 향긋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 ‘우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한 회원이 올려놓은 글이다. 우표에 대한 인기가 예전같지 않지만 그래도 새 우표를 손에 넣기 위해 우표발매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우정사업본부는 우리나라 우취인구가 12만5105명이라고 밝혔다. 우취인구란 우표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구체적인 통계는 새 우표가 발행될 때마다 일정 분량을 구입하겠다고 우체국에 등록한 사람들을 집계해 나온다. 이 인구가 2008년 13만여명, 1995년에는 22만1200여명이었는데 15년 만에 절반 정도로 준 셈이다.
그래도 우표수집하는 일이라면 돈 아끼지 않는 마니아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대개는 50대 이후 나이든 사람이 많지만 젊은 사람도 있다.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우표전시회에서 맛을 주제로 한 우표작품으로 대금메달(Large Gold Medal)을 수상한 김기훈씨는 올해 27세다. 세계 우표전시회 역대 수상자 중 최연소이며, 대금메달을 받은 최초의 아시아인이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소중하고 명예로운 것이지만 김씨가 받은 것은 우표계에선 더 가치있는 상이다.
김씨가 이번 수상작품 ‘맛의 역사’를 완성하는 데 우표와 자료 64장을 구입했다. 여기에 4억5000만원 가량을 투자했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비(非)우취인의 눈으로 보면 좀처럼 이해가 안가는 투자다. 하지만 지메네스 베르나드 테마틱 부문 심사위원장은 “여느 우표수집가들이 20년 걸릴 일을 아시아 청년이 해냈다. 이번 작품은 한국의 사회·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다가스카르에선 한국 우표가 여권 발급의 급행증으로 쓰이더니 런던에선 김씨의 우취작품이 한국의 사회·문화 발전상을 드러내는 상징물로 인식된 것이다. 우표의 힘은 이렇게 강하다.